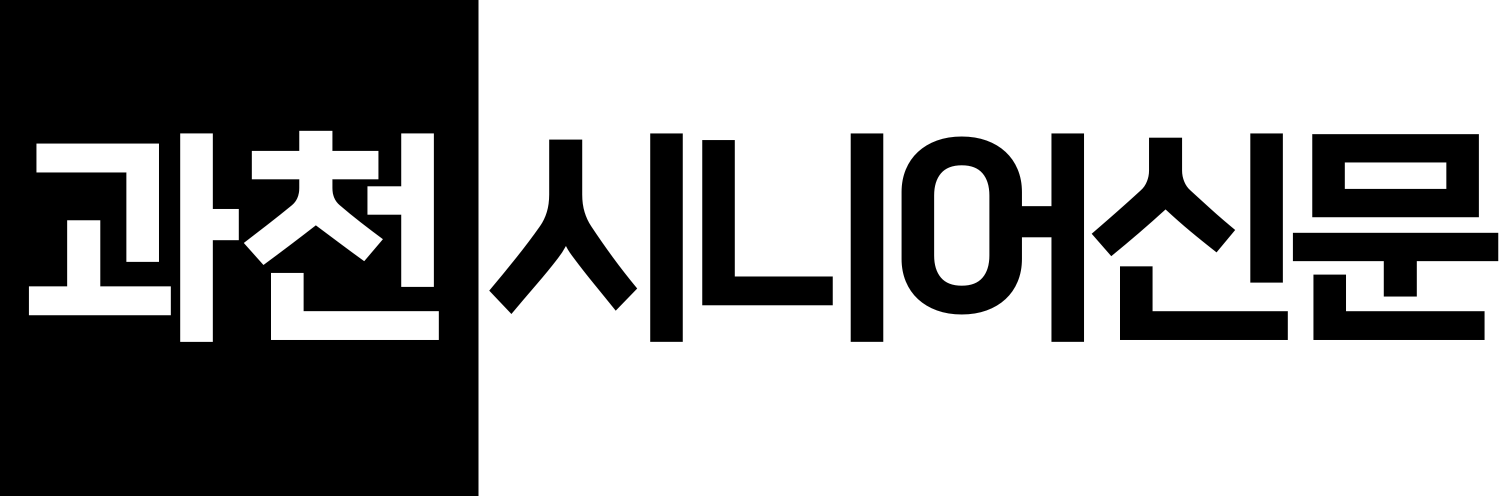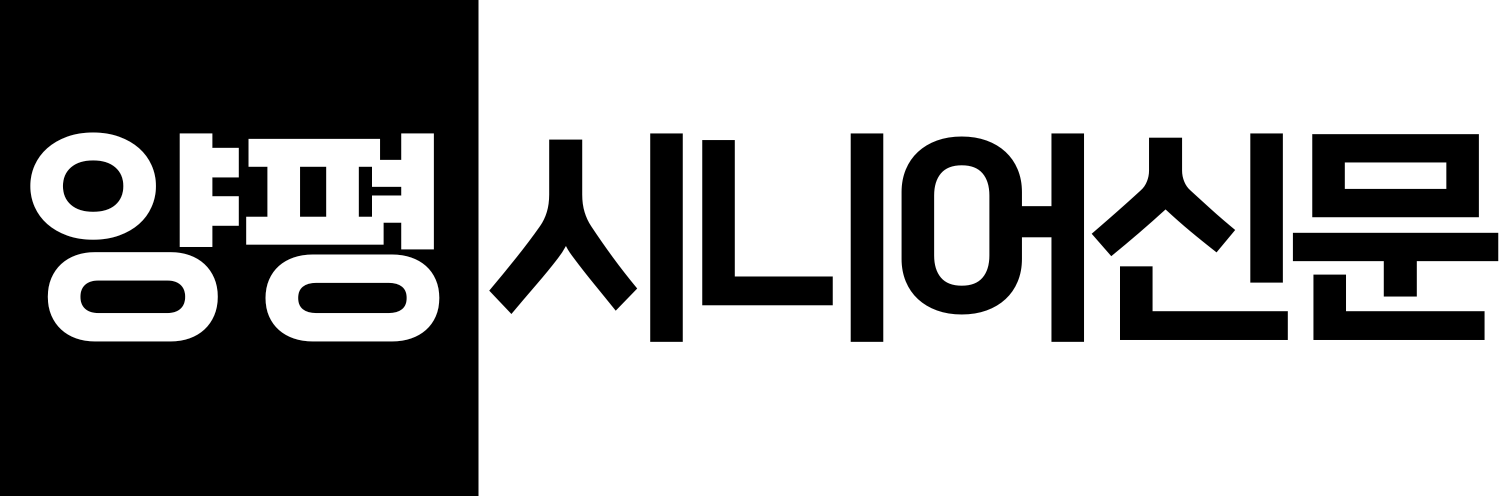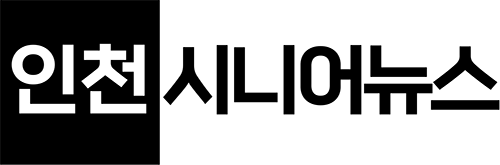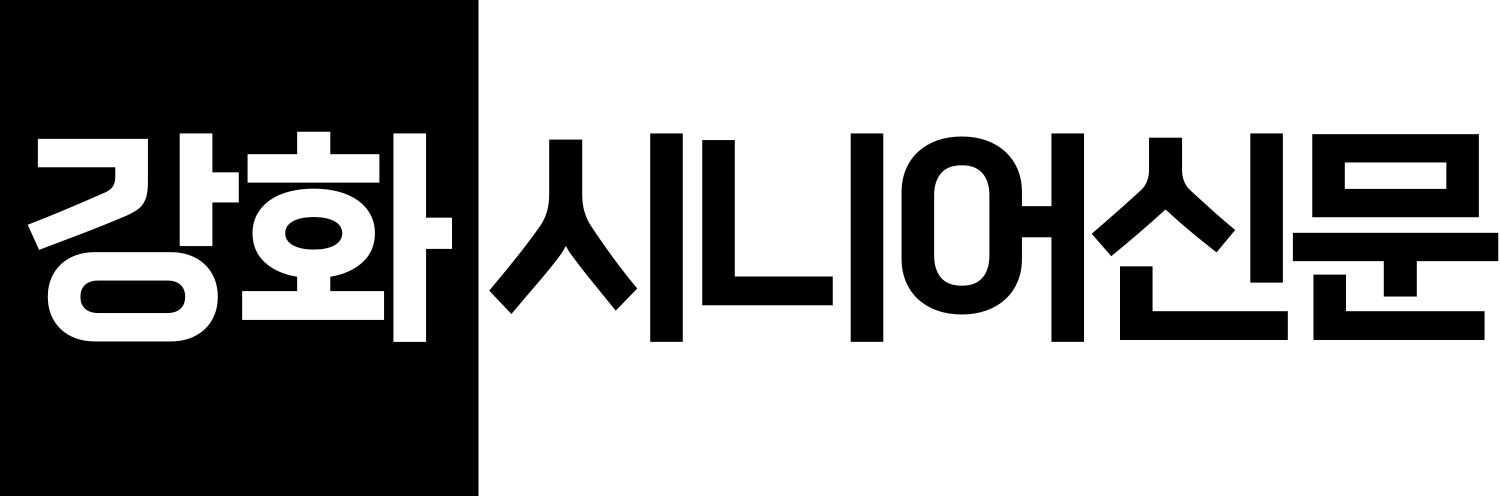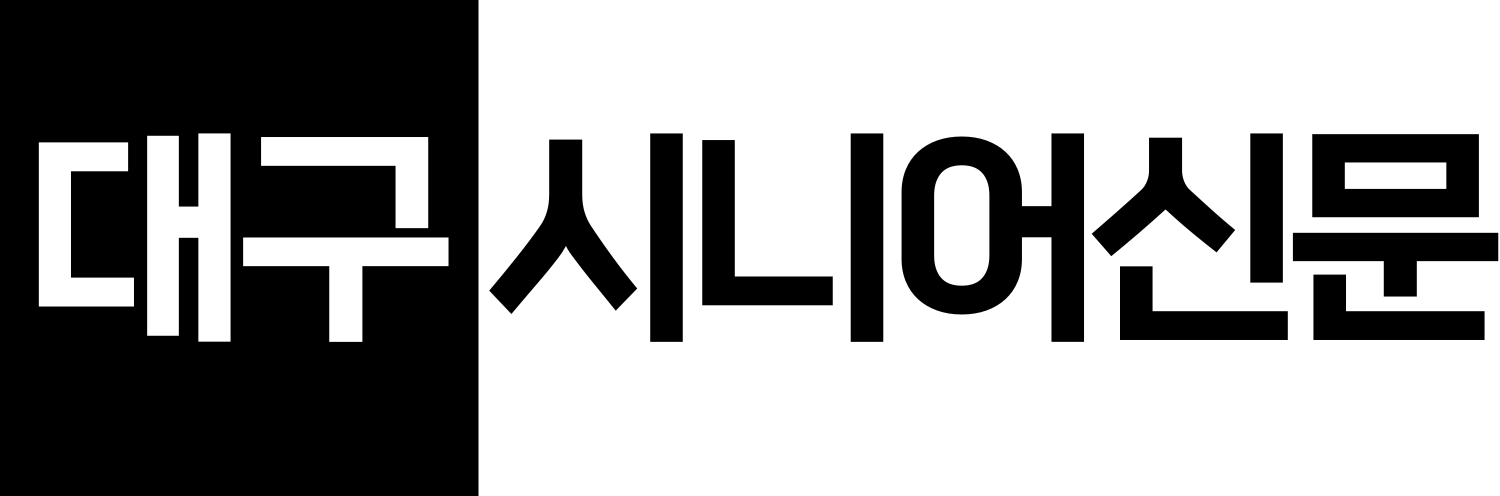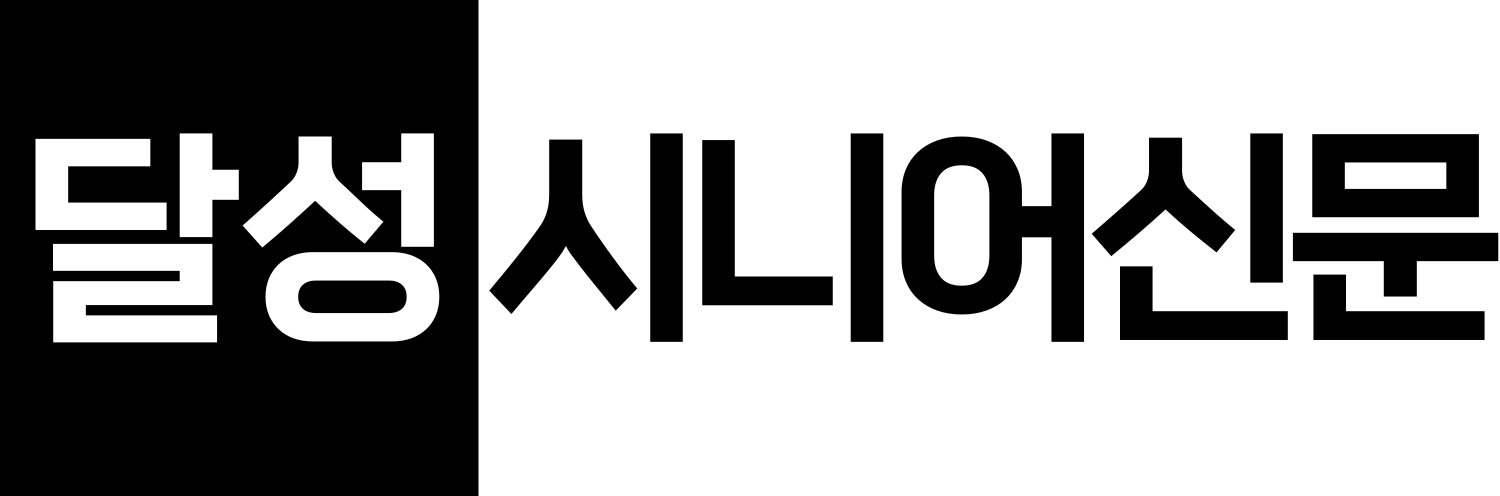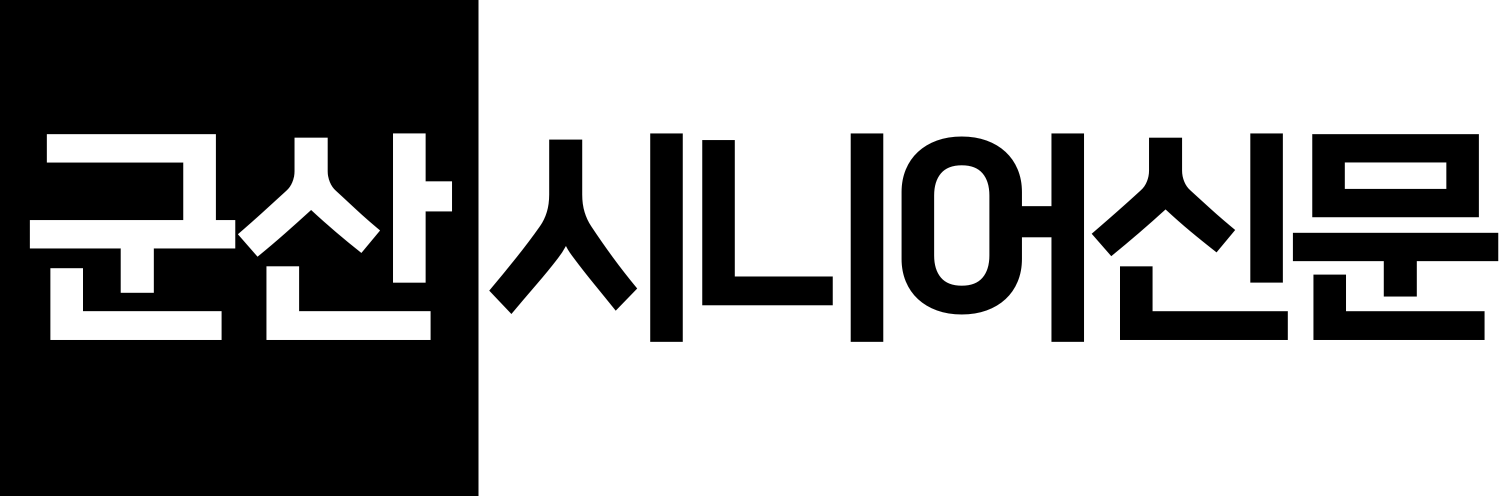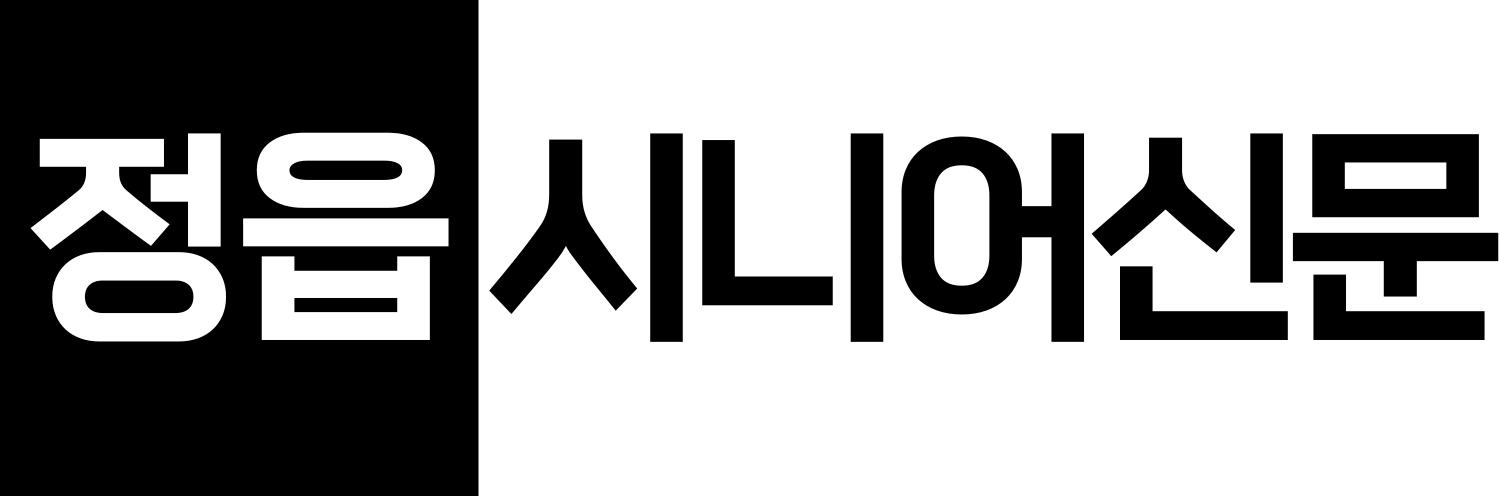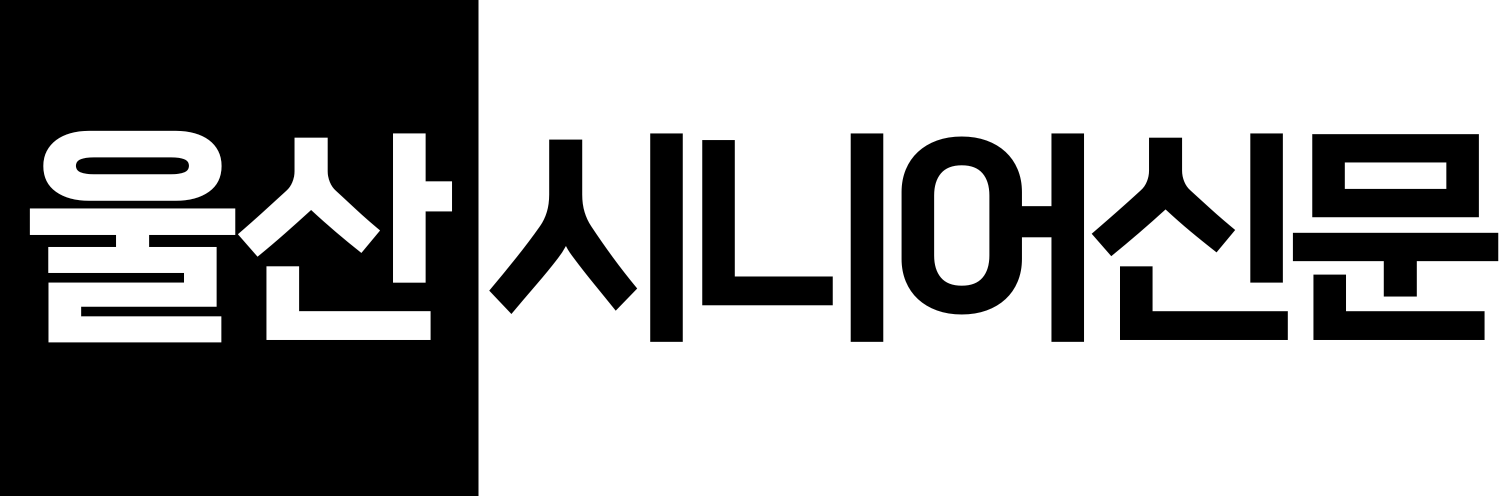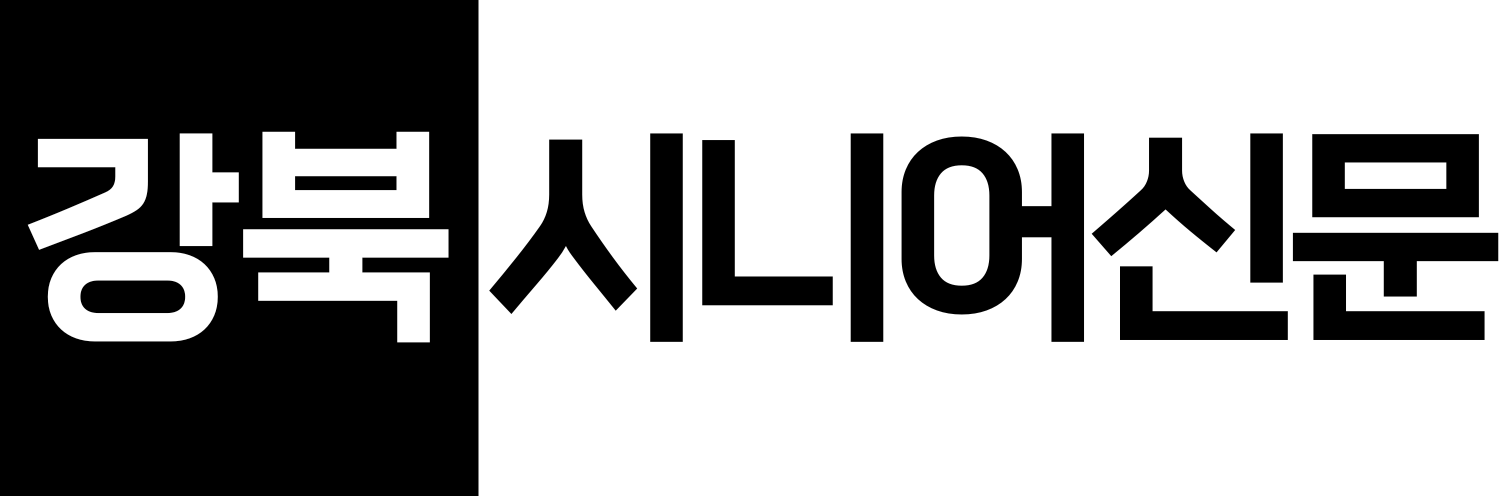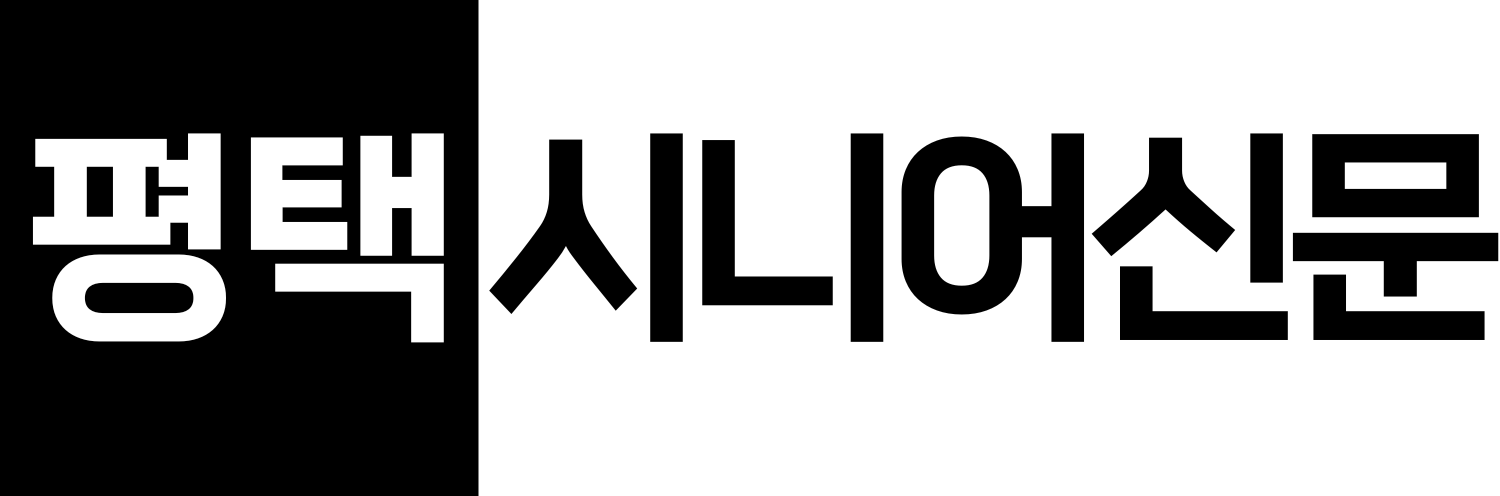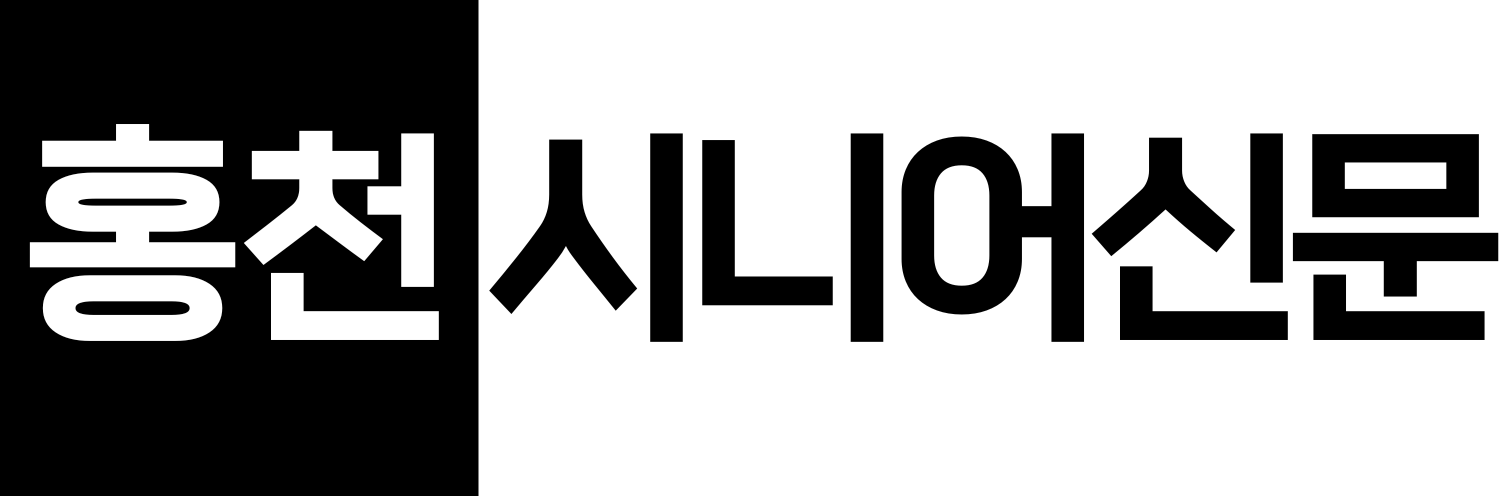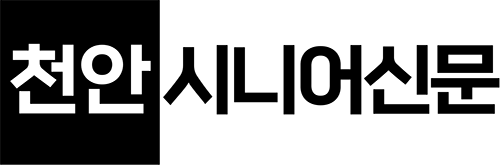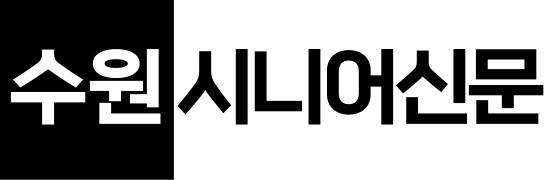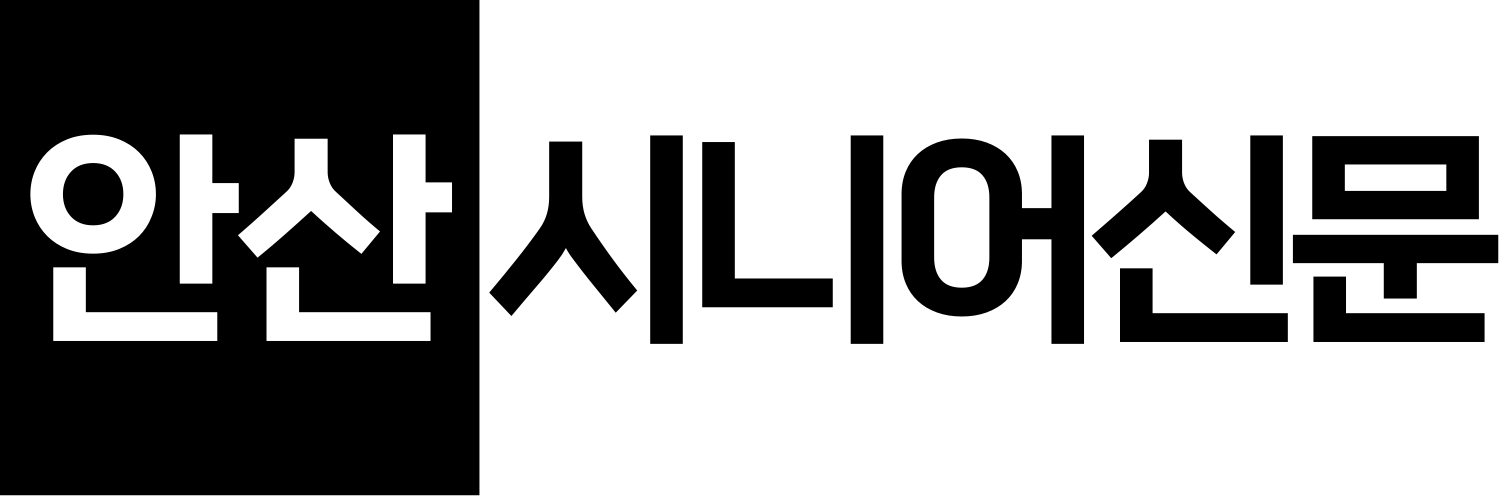사람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 했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농사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지 않았는가.
특히 고려∙조선 시대에는 수령이 임지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수령칠사(守令七事)중 으뜸이 농업을 장려하고 부흥시키는 일이었다. 당시에 농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항상 관리들의 수탈 대상이었고, 특히 이앙법이 보편화 되면서 광부나 상공인으로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농민들의 폐해가 극도로 심했던 때다.
그 후 해방이 되면서 전형적인 농업국으로 농업협동조합의 설립과 농지개혁은 국민의 큰 관심사였지만 그 활동은 미진했다. 1970~80년대에 들어서야 지금의 농업협동조직을 통해 생산력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특수법인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통적 농업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절기가 되면 논밭을 갈고, 곡식이나 필요한 씨앗을 적기에 뿌려서, 열심히 가꾸고 거두는 일이 농민들의 일상생활이었다.
농사는 한 가정의 생업이며 주업이었기에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효도의 근본으로 알고 이를 지키며 살았다. 특히 종자 고르는 것은 농업인으로서 사명감으로 알아 자기 집 가계의 혈통만큼이나 소중하게 다루며 살았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힘들고 어려운 농업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도 농업은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기초이기에 묵묵히 농토를 지키며 기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마음은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추석을 앞둔 시기에 날씨에 따라 수확에 변화가 생길까 걱정하는 농민들도 많다.
농민들은 항상 올해 농사의 결실을 걱정하며 논밭으로 다니며 농작물을 가꾸고 보살핀다. 그 때문에 들에 나가보면 황금벌판이 눈앞에 들어오는 것은 그동안 수고한 농민들의 땀방울이 맺힌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수입상품에 말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우리 농산물, 서민들과 농민들이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풍년을 맞이하고도 걱정하는 농민이나 서민들이 없도록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되새기는 가을이 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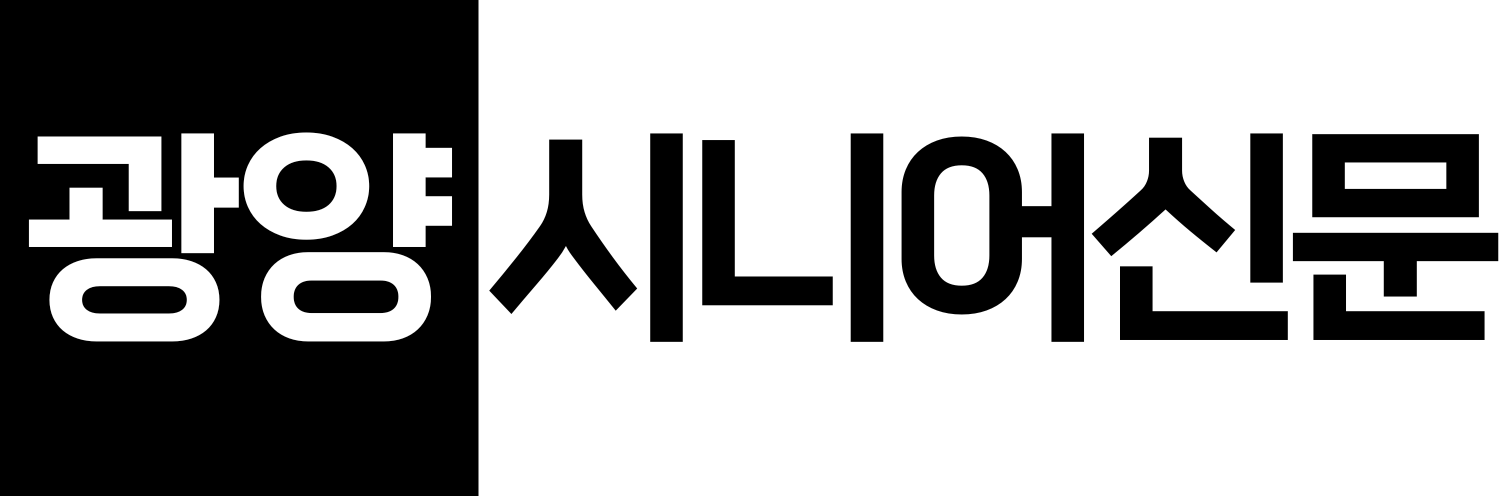













![[기자수첩] 광양 우산공원 유아숲 체험장, 숲 체험 ‘자연 놀이터’ 자리매김](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1/희망찬특수어린이집-218x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