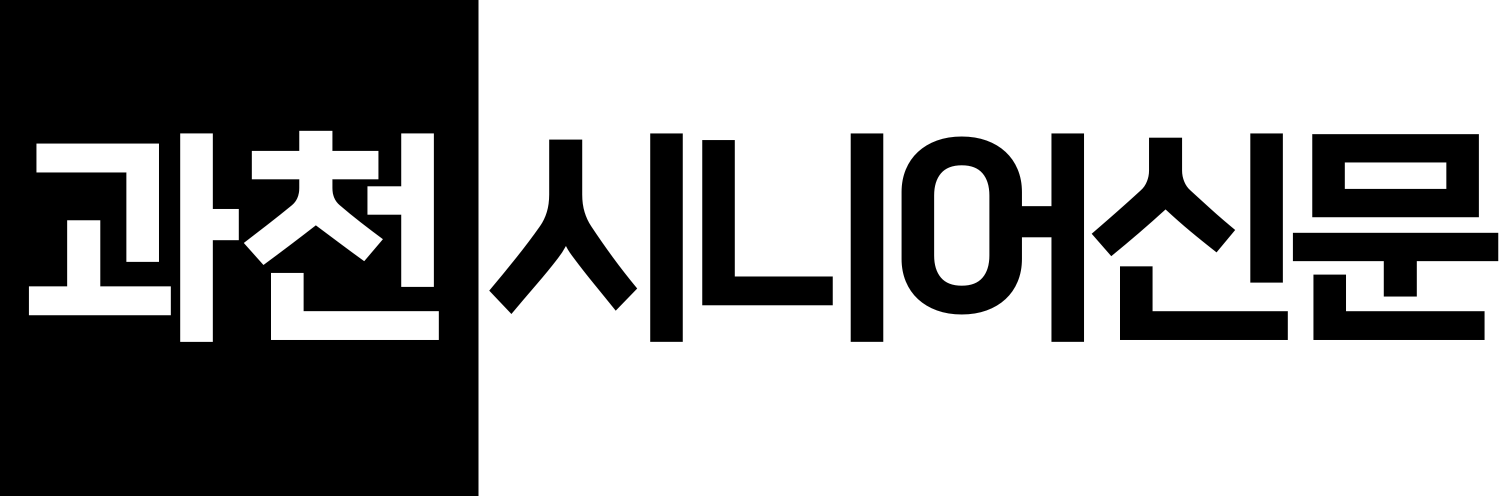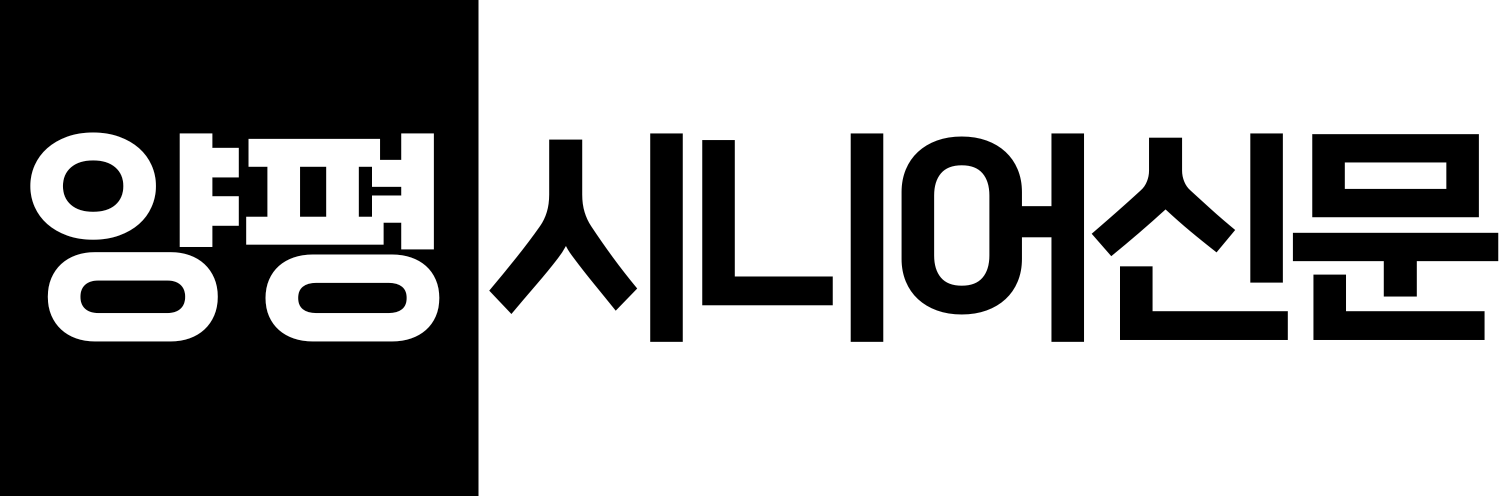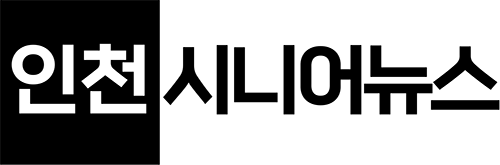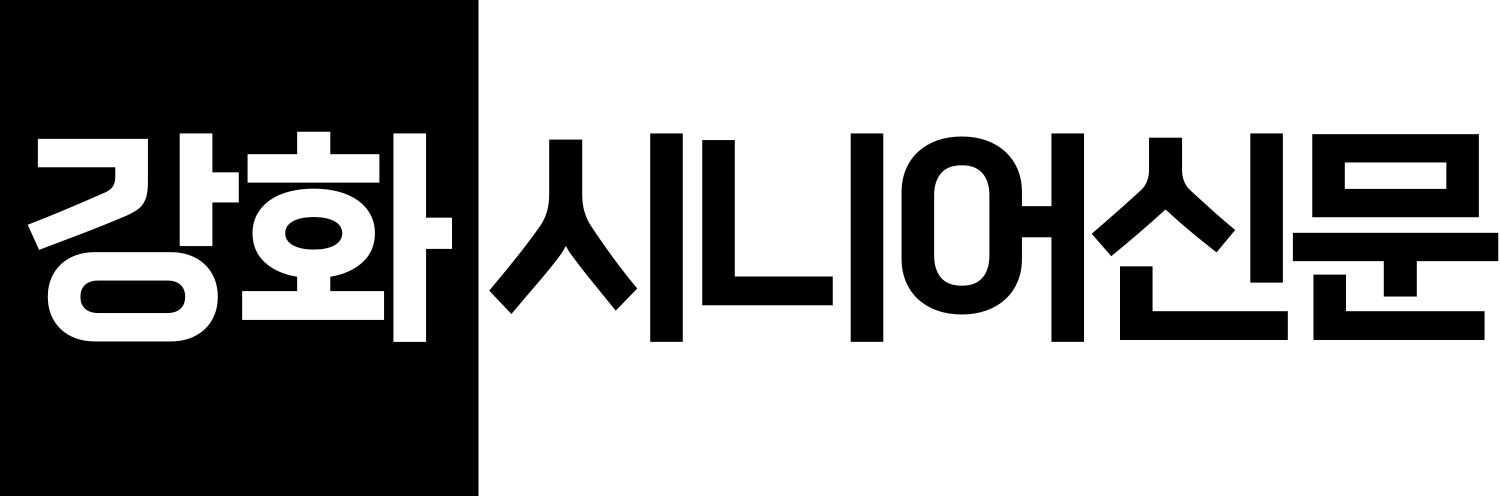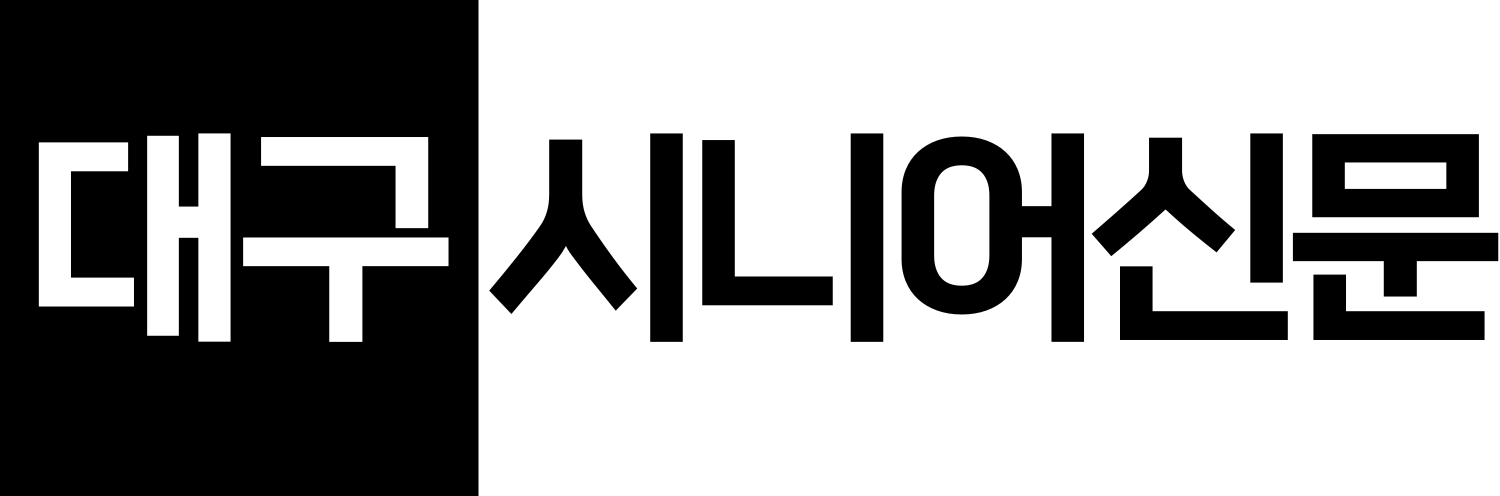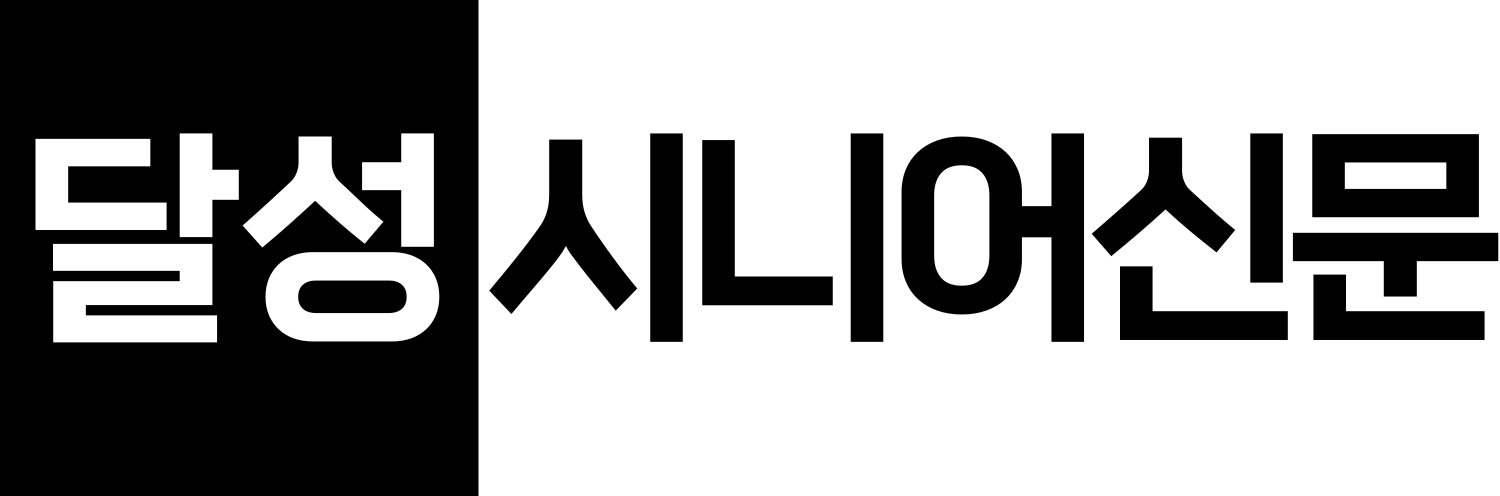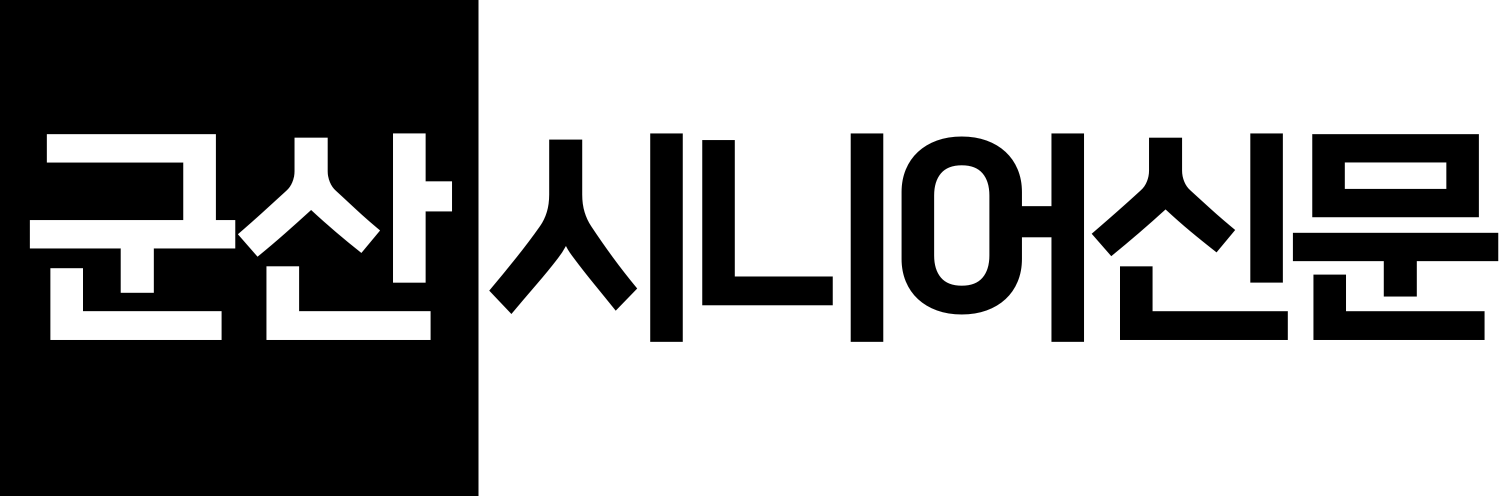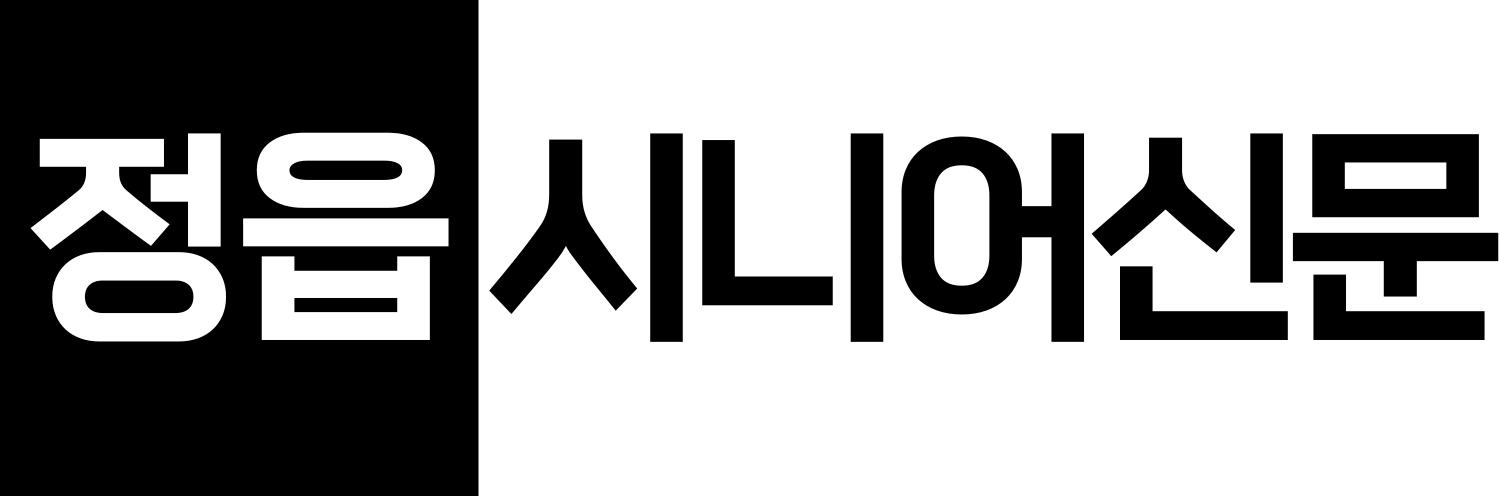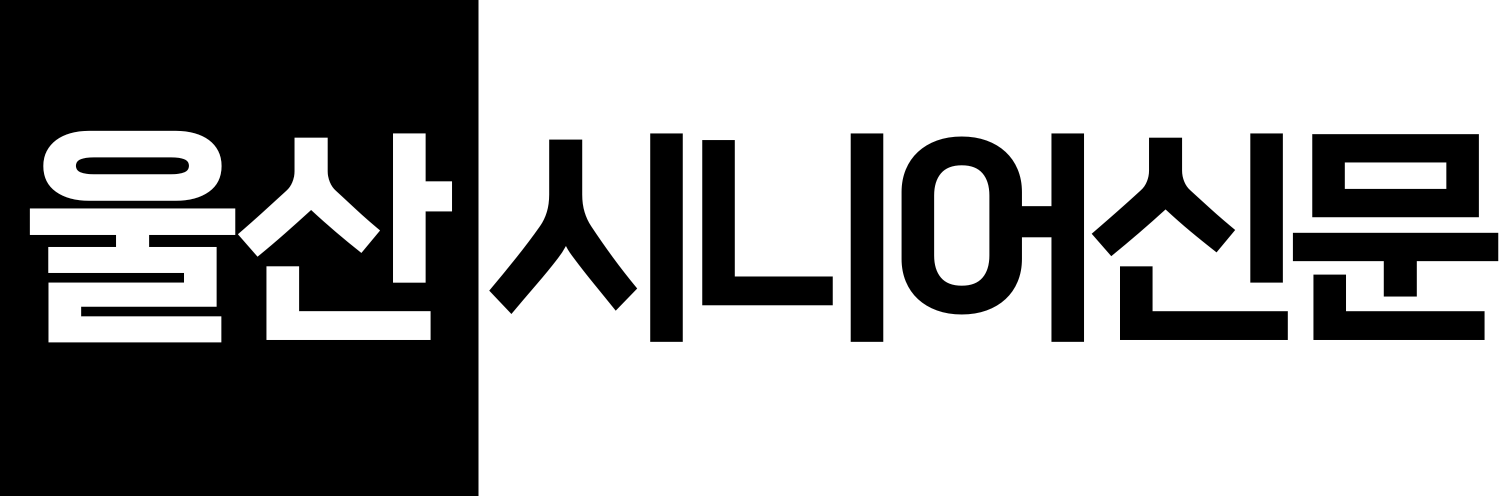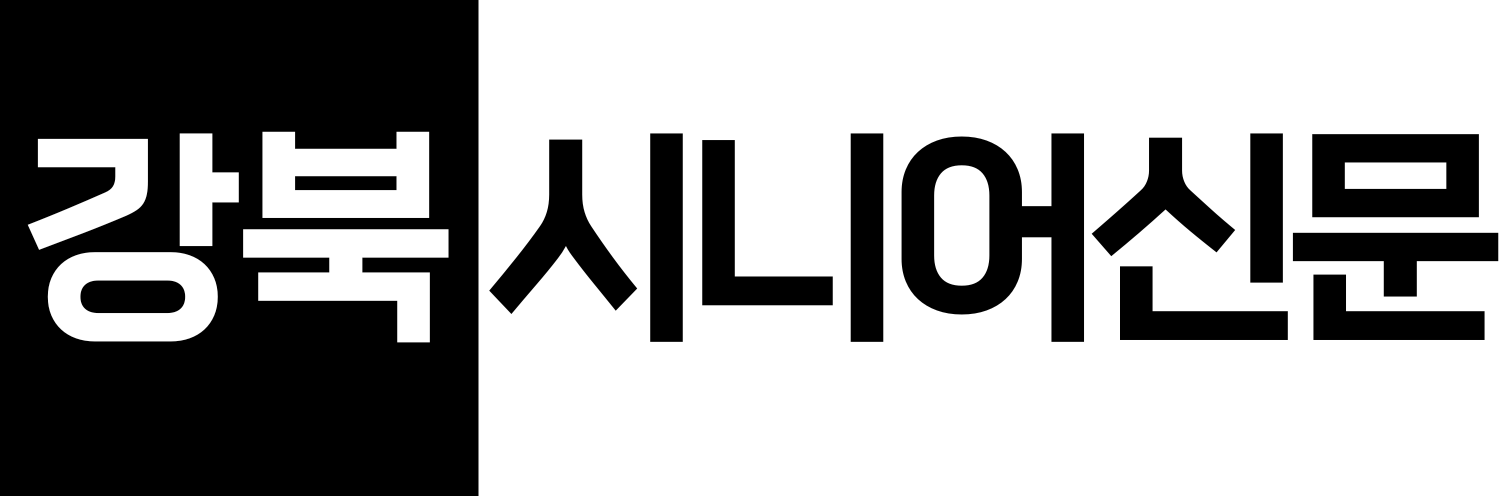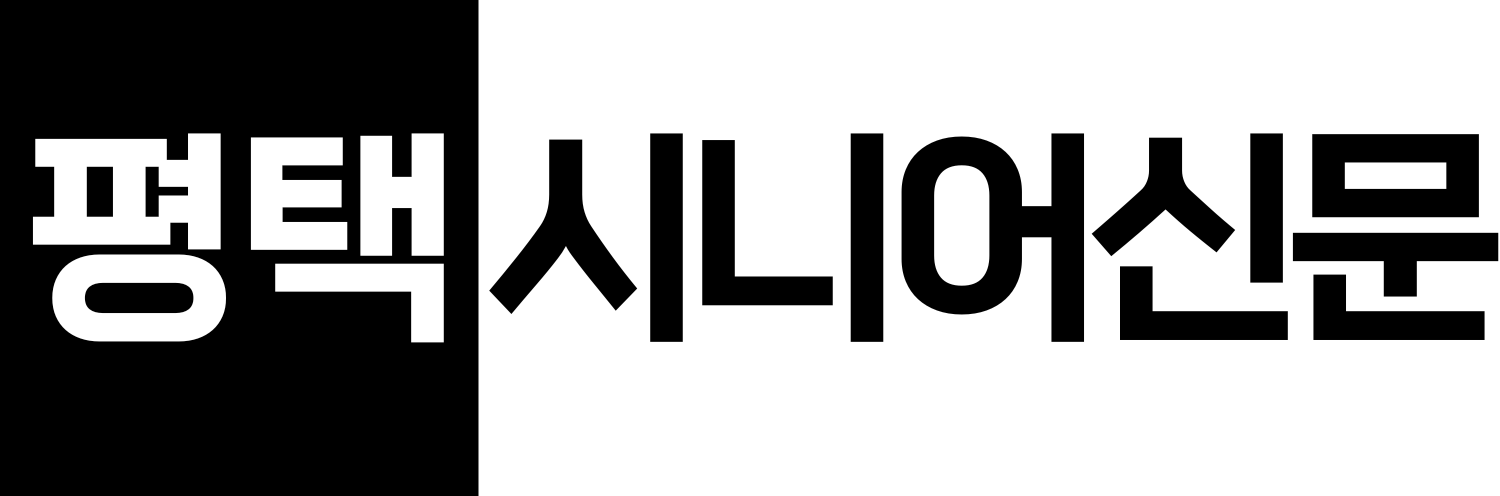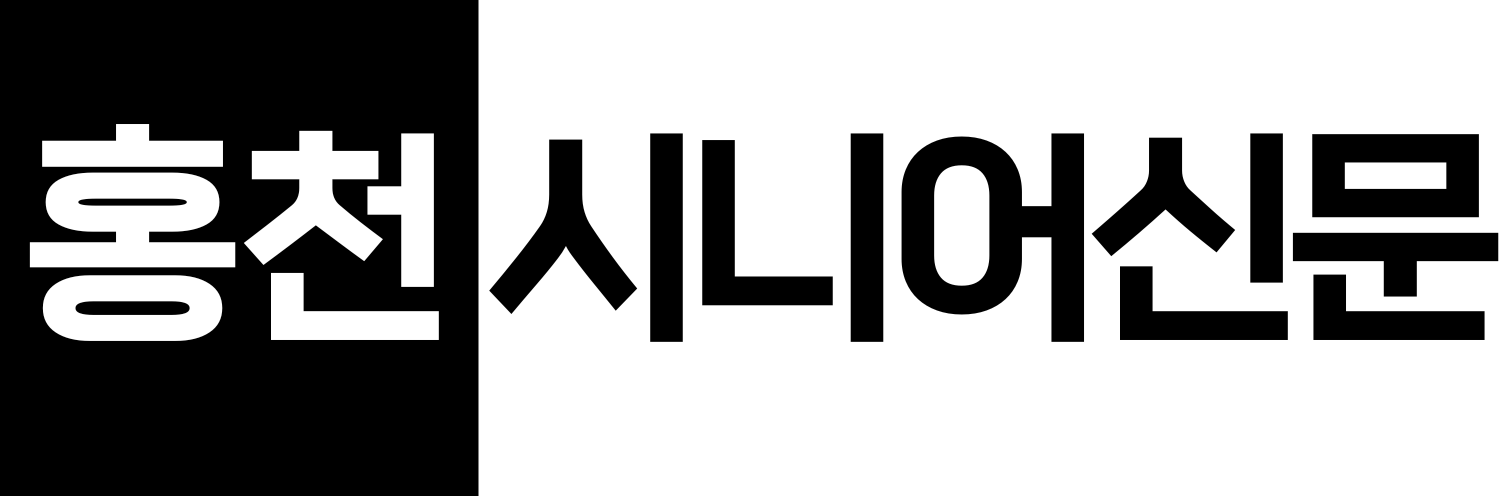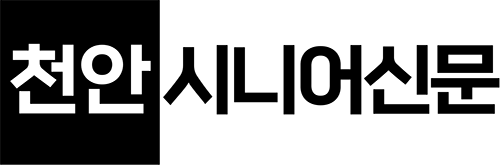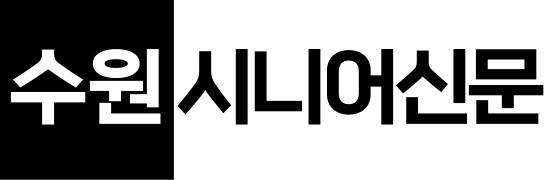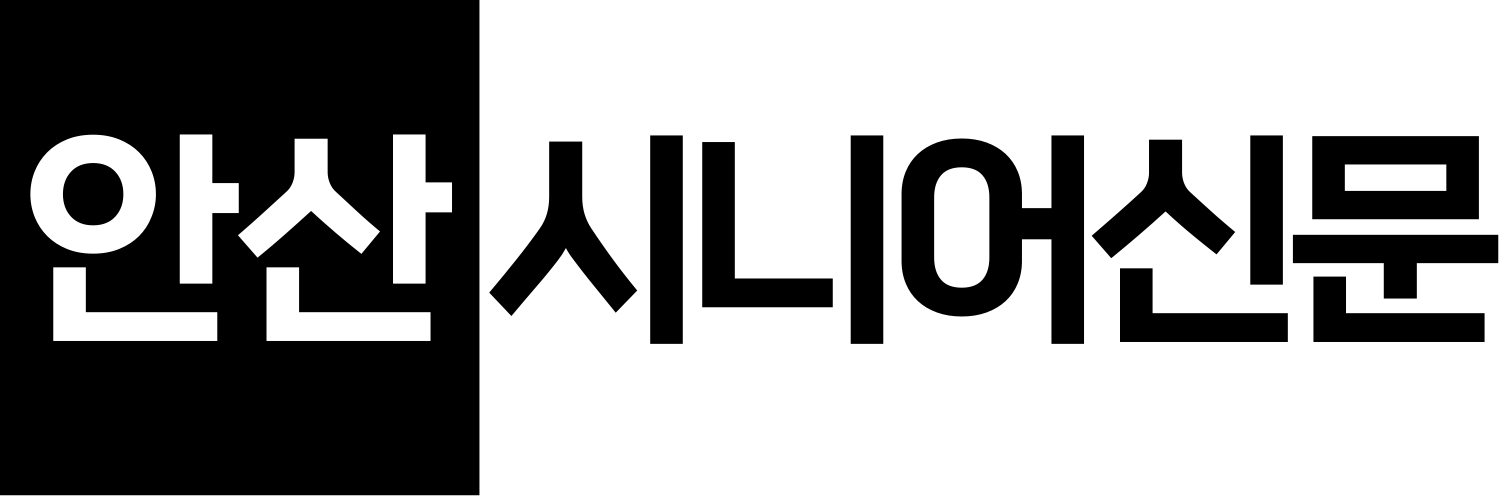11월이 되면 어김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마무리된다. 봉사 현장, 공공근로, 경로당 지원, 환경정화, 복지시설 보조, 그리고 지역행정 도우미까지 수많은 시니어들이 다시 일터를 떠난다. 어떤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누군가는 탈락 소식에 허탈해하며 관계기관을 찾아가 하소연한다. 누군가는 동료와의 불화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이어주는 끈이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고 고요하다. 처음에는 여유롭지만 곧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이 찾아온다. 가족이 직장으로 떠난 낮 시간, 집 안의 적막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이때 노인일자리는 시니어들에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루의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일이 즐거움이 된다.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은 그 어떤 연금보다 큰 위로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다르면서도 닮아 있다.
공공시설에서 환경미화로 일하는 한 어르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학교 급식 보조를 맡은 할머니는 “아이들이 인사할 때마다 힘이 난다”고 웃는다.
하지만 일자리가 끝나면 다시 긴 공백이 시작된다. “일이 없어지면 몸도 마음도 금세 처져요.” 그 한마디에는 시니어 일자리의 절박한 현실이 담겨 있다.
일터에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일하다 보면 불편함이 생긴다. 누군가는 역할 분담에 불만을 품고, 누군가는 의견 충돌로 일을 그만둔다.
또 한편에서는 탈락의 상처가 깊다.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며 항의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그 일자리가 곧 자신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현장에서는 자존감의 회복과 성장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하던 어르신은 책을 정리하며 “어릴 적 꿈을 다시 만났다”고 했다. 도시락 배달 사업에 참여한 할아버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고 했다.
한 번도 컴퓨터를 다뤄본 적 없던 어르신이 행정 지원 업무를 맡아 엑셀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은 일도 있다.
그들에게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롭게 배우는 삶의 무대였다.
물론, 수당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 돈으로 손주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가족 외식을 한 번 대접할 수 있을 때, 어르신들은 세상 그 어떤 월급보다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아직은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삶의 중심이 다시 선다.
이제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평균수명이 85세를 넘긴 시대에, 시니어가 사회 속에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활력 복지’이자 ‘존재 복지’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단기성 사업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끊기면 다시 무기력과 고립이 찾아오고, 새로 시작하려면 또 경쟁해야 한다.
시니어 일자리가 단순한 ‘임시 일터’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된 사회 참여의 통로로 자리 잡을 때, 노년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존엄해질 것이다.
11월의 끝자락, 일자리가 끝나고도 여전히 새벽을 향해 걷는 어르신들이 있다.
그들의 발걸음 속에는 ‘살아 있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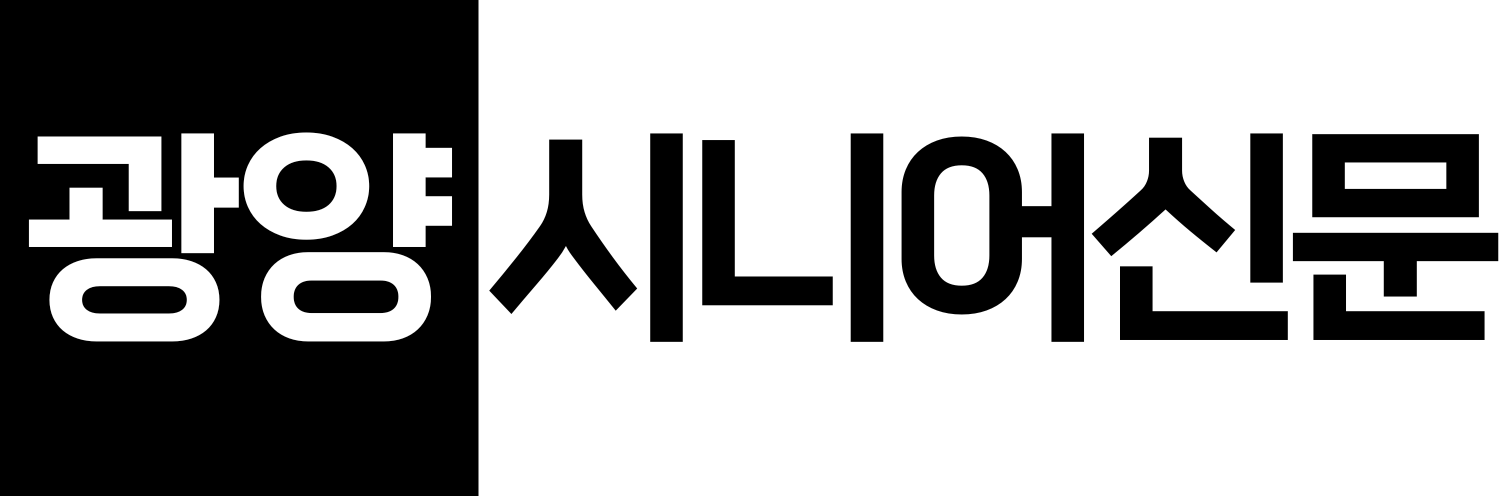
![[취재하다 만난 광양의 밥상] ③ 백운산 자락 도선국사마을, 선은손두부 한 그릇의 온기](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백운산-218x150.jpg)
![[길 위의 광양사(史), 유물이 말을 걸다] ⑤ 옥룡사지(玉龍寺址) – 절은 사라지고 뜻은 남다](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옥룡사지추춧돌1-218x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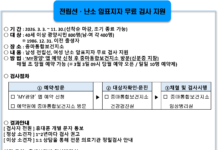

![[기자수첩] 가마솥 뚝배기 한 그릇이 전하는 온기](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가마솥뚝배기-1-218x150.jpg)